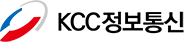KCC NEWS
컴퓨터 1세대로 꼽히는 KCC정보통신 이주용 회장과 그의 뒤를 잇고 있는 아들 이상현 대표. 부자(父子)가 처음으로 언론에 함께 나왔다. ‘기업은 내 것이 아니라 사회 것’이라고 입을 모으는 아버지와 아들의 사연은 많은 울림을 준다아들 놈은 지 잘난 맛에 살아서 싫어요. 아들에게 회사를 물려줄 생각이 없었죠. 후계자 문제가 생겨서 어쩔 수 없이 물려준 거에요.” “아버지는 딸만 좋아하고 아들은 미워해요. 아버지랑 맘이 안맞아서 가출도 많이 했어요.”서로 불만을 털어놓는 부자(父子). 언뜻 보면 불화가 있는 것 같지만, 두 사람의 대화는 정겹기만 하다. 이들은 ‘컴퓨터 산업의 개척자’로 평가 받는 이주용(81) KCC정보통신 회장과 그 뒤를 이어 경영에 뛰어든 아들 이상현(48) 대표다. 서울 강서구에 있는 KCC오토타워에서 만난 두 사람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서 동지와 같은 느낌을 준다. 부자가 함께 인터뷰에 나선 것은 포브스코리아가 처음이다.이 회장은 자신을 “기업가가 아니라 파이오니어(개척자)”라고 소개했다. “상현이가 기업가예요. 나보다 기업 운영을 더 잘합니다.” 개척자와 기업가의 절묘한 조화 덕분일까. KCC정보통신은 많은 난관을 이겨내며 47년을 이어오고 있다.이주용 회장, 한국에 컴퓨터 도입 산파 역할이 회장은 미국 IBM에 입사한 최초의 한국인, 한국 최초의 IT 기업 설립 등 ‘최초’라는 기록을 많이 갖고 있다. 그는 IBM이라는 좋은 우산 밑에서 넉넉한 월급에 ‘능력있는 엔지니어’로 대접 받으면서 미국에 뿌리 내릴 수도 있었다. 1960년대 초반 직원이 10만 명이었던 IBM의 연매출은 한국의 국민총생산(GNP) 30억 달러보다 많았다.하지만 1966년 이 회장은 안락한 미국 생활을 정리하고 한국생산성본부 산하 전자계산소(KCC정보통신의 전신)로 자리를 옮겼다. 컴퓨터 불모지인 한국에 컴퓨터를 소개해야 한다는 일념 때문이다. “앞으로 컴퓨터 세상이 된다”는 이 회장의 말에 컴퓨터가 꼭 필요했던 정부 부처, 기업, 은행권 등에선 ‘비싸다’ ‘컴퓨터를 어디에 쓰냐’ ‘주판이 훨씬 좋다’는 답변이 돌아왔다. 하지만 이에 굴하지 않고 “또 다른 산업혁명은 컴퓨터에서 시작된다”는 믿음으로 컴퓨터 전도사를 자처했다. 이 회장이 자신을 개척자라고 부르는 이유다.이 회장의 활동은 한국 컴퓨터 도입 역사와 일치한다. 1967년 Facom222 컴퓨터를 최초로 도입하고 한국은행이 선두로 나선 금융 전산화 사업 등을 이끌었다. 키펀치 수출사업, 주민등록 전산화, 김포국제공항 실시간 전산화, 철도청 온라인 시스템 등 컴퓨터를 통한 전산화 작업도 KCC정보통신 손에서 이뤄졌다. 한창 잘 나갈 땐 연간 100만 달러가 넘는 외화를 벌어들였다.당시 이 회장은 저돌적이었다. 좋은 계약을 따내기 위해 기상천외한 계약서를 내밀기도 했고, 한국인이라고 깔보는 외국인에겐 욕도 스스럼없이 했다. “사명감과 의욕이 넘칠 때였어요. 돈 벌겠다는 생각보다 보람 있는 일을 한다는 생각에 거칠 것이 없었죠.” 그는 주민등록번호 전산화 작업과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에 참여했던 일을 가장 뿌듯하게 여겼다.